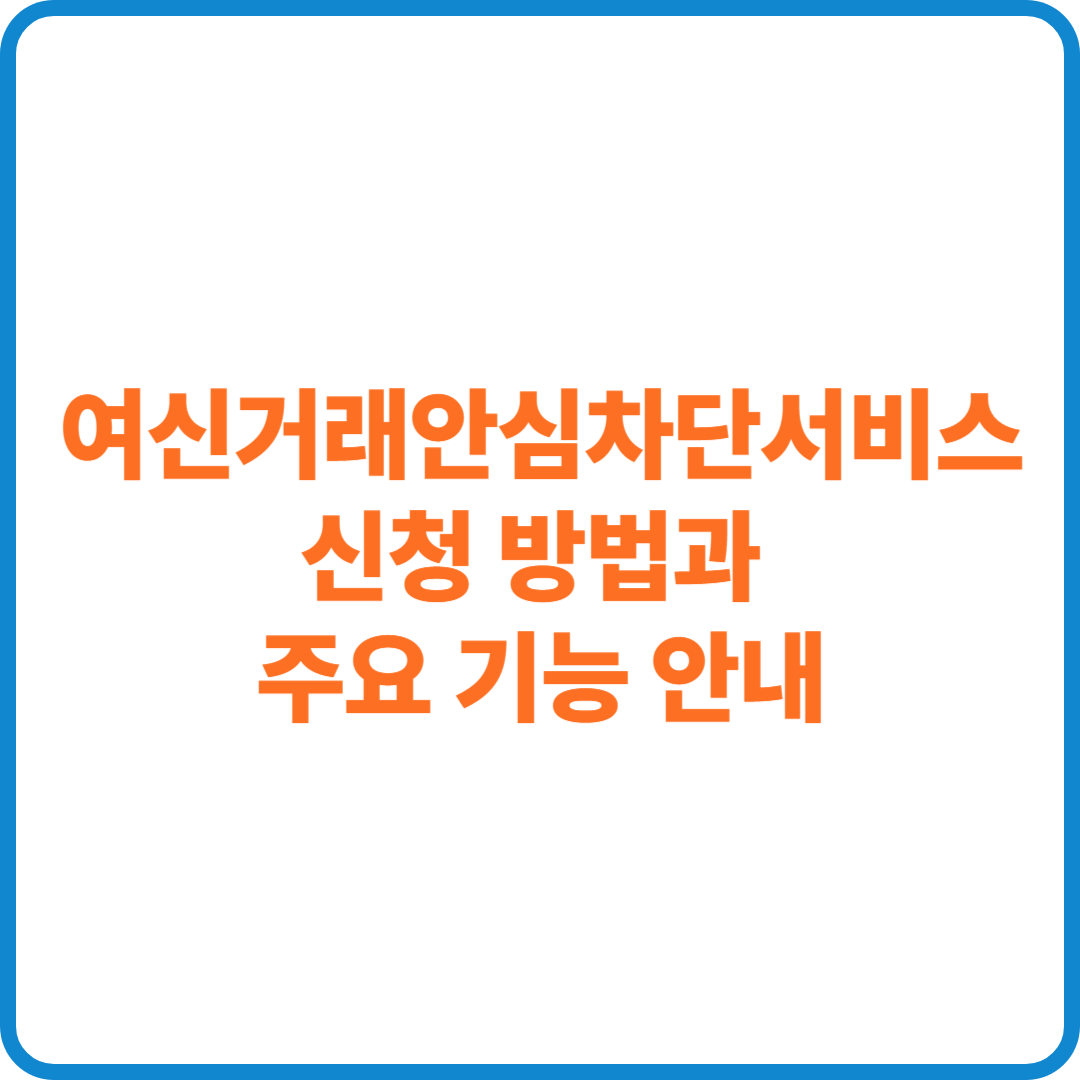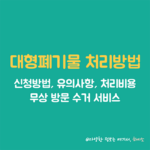광양의 쌀은 매실이나 불고기의 유명세에 가려 그 가치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광양은 간척지에서 생산하는 쌀을 비롯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쌀은 ‘오감이 통한 쌀’등 고유 브랜드로 서울 등 대도시에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부 호남에 비하면 논 면적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쌀은 광양에서도 주요 작물이었다. 따라서 광양 지방에서도 봄철이 되면 모내기를 했고 못밥을 지었다.
다양한 나물과 생선으로 풍성한 광양 못밥의 매력

‘논농사지대본’인 모내기 음식이 못밥
일 년 열두 달, 농촌에서는 달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시기를 놓치면 일 년 농사를 망치기 때문이다. 농가월령가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이런 사정과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광양도 예외가 아니었다. 때가 되면 그 시기에 맞는 농사일을 해야 했다. 일 년 농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모내기가 될 것이다. 일 년 농사의 반이 라는 못자리를 만들고, 무사히 자란 모를 논에 정식하는 일이 모내기다.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던 시절, 천수답에 벼 포기를 무사히 심었다는 사실은 농부로서 가슴 뿌듯한 일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백일과 돌을 무사히 지내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것이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가.
모내기는 노동 강도가 높고 공동 작업 형태로 진행한다. 푹푹 빠지는 논 속에 서서 발을 옮기는 것 자체가 힘들다. 계속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통도 심하다. 그나마 여럿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위안이 된다.
모내기는 농부에게 기쁜 일이자 고된 일이다. 모를 내게 되어 기분 좋으니 일꾼들에게 인심을 쓰고 싶어진다.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건 음식을 차려 대접하게 된다. 또 열량소모가 큰 힘든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현실적으로 잘 먹여야 할 필요도 있었다. 여기에 누구네 집 못밥은 어떻더라’하는 이웃의평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나물과 생선류 푸짐하고 다양한 광양 못밥
농사일 가운데 가장 큰 행사였던 모내기를 할 때 논가나 논두렁에서 먹는 밥이 ‘못밥’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논농사가 있는 농촌에서는 모내기철에 못밥을 내갔다. 광양도 마찬가지다. 못밥 음식은 전국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김치, 나물, 장아찌, 쌈, 생선, 국이 대표적인 음식이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지방마다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씩 다르다.
광양못밥을 담은 광주리에는 다음과 같은 음식들이 주로 들어있었다.
김치류에는 고구마대 김치와 초피 열무김치, 나물류에는 고사리나물, 취나물, 도라지나물, 미나리나물, 가지 나물, 고구마 대 나물, 머위대 나물, 콩나물이 있다. 생선류에는 서대조림, 갈치떼기 조림, 오징어미나리회, 꼬막장, 돌게장, 잔조기구이가 들어갔고, 국과 찌개류는 콩나물설치와 바지락감자미역국에 꽃게탕도 내갔다. 밥은 쌀밥과 찰밥, 그리고 못밥에는 빠질 수 없는 된장과 쌈채류와 풋고추에 막걸리가 들어갔다. 이 상차림은 농가의 경제적 여건이나 일꾼의 숫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광양못밥은 몇 가지 특징을 지녔다.
우선, 다른 지방에 비해 나물과 생선류 반찬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백운산 자락과 남해 바다를 끼고 있는 광양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점이다. 다른 지방보다 장아찌류가 드문 것도 광양 못밥의 특징이다. 다른 지방보다 풍부한 장아찌 식재료를 보유한 광양으로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다. 초피를 넣은 초피열무김치, 갈치떼기 조림, 콩나물설치, 바지락감자미역국 등은 다른 지방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양 지방의 특색이 잘 나타난 못밥 음식이다.
광양못밥은 우리나라 못밥의 일반적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요리라기보다는 밥과 반찬의 소박한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자 않았다는 점, 땀을 많이 흘리는 일꾼들을 위해 음식의 짭짤하고 냉국 등 시원한 음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등이다.
못밥과 함께 했을 광양의 모심기 노래 두 편
광양에는 두 편의 모심기 노래가 전해진다. 「광양시지」의 구비전승 편에 보면 광양시, 중동에서 1989년에 강만석(1914년생) 할아버지로부터 채록한 것과 같은 해에 광양읍 사곡리에서 문종업(1919년생) 할머니로부터 채록한 것이다.
먼저, 강만석 할아버지가 불렀던 모심기 노래를 들어보자. 이 모심기는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널리 펴져있는 농부가의 광양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이 좋은 사람이 선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창으로 따라불렀다. 고된 모내기의 피로감을 잊고 모내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렀던 전형적인 노동요다.
모심기 노래는 맛좋은 못밥과 함께 일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노동의 고단함을 상쇄시켜주었던 중요한 장치였다.
아나 농부야 말 들어라 / 여보소 친구님네
이내 한 말을 들어보소 / 아~나 농부야 말 들어라
남훈정 달 밝은 밤 / 순임금의 노름이요
학창의 푸른솔은 / 산신님의 놀음이라
오뉴월 당도하니 / 우리 농부들 시절인가
패랭이 꼭지다 장화를 꽂고서
마우라비 춤이나 추어보세
헤 여 허여여어루 / 상사 뒤이여
아나 농부야 말 들어라 / 여보소 친구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 아~나 농부야 말들어라
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 / 월출 동년에 달 솟아온다
여 여 어여여어루 / 상사 뒤이여
강만석 할아버지가 불렀던 모심기 노래가 남성들이 논에서 실제 모내기를 하면서 불렀던 실용성 있는 모심기 노래였다면, 문종업(1919년생) 할머니의 모심기 노래는 시집온 새댁이 고달픈 시집살이를 모심기에 빗대어 한탄하는 노래다.
시집오던 사흘만에 ~ / 모숨그로 가라해서
모 한폭질을 꽃고나서 / 비단 공단 감던 몸에 ~
닷새베가 웬일인가 / 은가락지 찌던 손에 ~
모폭지가 웬일인가 / 간단까지 신던 발에
헌 짚시기 원일인가 / 시아바니 나오더니-
아강 아강 며눌아강 ~ / 손발씻고 들오니라
두폭질을 꼽고 난께 / 시어머니 나오더니
아강 아강 며눌아강 ~ / 손발씻고 들오니라
세폭질을 꼽고 난께 / 시누애씨 나오더니
성님 성님 올캐성님 / 손발씻고 들오시오
손발씻고 들어간께 / 애편사다 얹어놓고
(중략)
한편, 진상면 황죽리 구황마을의 서기남(1937년생) 할머니가 부른 모노래도 있다. 어서 빨리 벼가 자라 수확했으면 하는 간절합이 녹아있는 노래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덜 크고 새덜크고 / 칠팔월에 열매열제
함께 보면 좋은 글
광양의 봄 음식 고로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