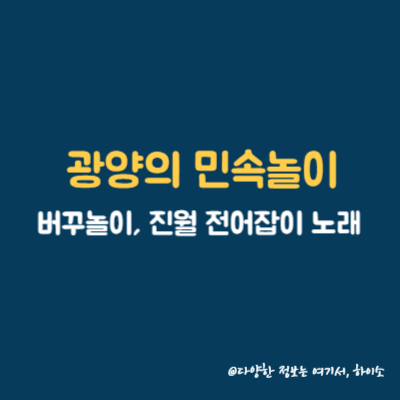광양에는 예로부터 다양한 민속놀이가 계승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게 버꾸놀이, 용지 큰줄다리기, 진월 전어잡이 노래가 있다.

1. 광양 버꾸놀이
○ 앉은뱅이가 일어선다는 북놀이 위주의 흥겨운 농악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 농악이 소고와 장고를 위주로 버꾸놀이를 벌이는 것과는 달리 광양 버꾸놀이는 북소리가 한 가지 더 있으며 북놀이 위주로 농악을 펼치므로 흐름이 다양하고 흥겹다. 농악대가 45명일 경우 보통 10명 정도 북을 치는데 북소리가 박진감 있고 경쾌하며 흥겹고 신명나서 광양 버꾸놀이 판에서는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전해온다.
○ 현란한 가락에 정갈한 몸놀림
광양 버꾸놀이에서 보여주는 북배김은 일반적으로 북배김이 북 복판을 두드리는데 비해 북 복판과 함께 상단과 하단의 나무 테두리를 매번 두드림으로써 가죽과 나무를 한 가락에 울려대는데 “덩덩 따그닥 딱, 덩덩 따그닥 딱딱” 소리가 특이하고 아름답다. 북잽이의 손놀림 또한 일반적인 북잽이 보다 3배 가량 빠르며 정교하고 현란하다.
그리고 북잽이들의 몸놀림은 북가락에 맞추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대고 어깨죽지를 추켜올리는 품새가 매우 흥겹고 발놀림은 땅 위를 스치듯 사뿐사뿐 내딛거나 살짝살짝 들어올려 절제된 동작을 보인다. 이처럼 광양 버꾸놀이의 전체적인 몸놀림은 흥겨우면서도 정갈하다.
○ 김매기 마친 후 농군들이 덕석기 앞세우고 농악놀이
광양 버꾸놀이는 김매기를 마친 후 농군들이 편을 갈라 벌이는 농군 농악에서 비롯되었다.
농군들은 멍석만큼 큰 덕석기를 앞세우고 양편으로 나뉘어 솜씨를 자랑하는데 농악놀이는 대개 길굿 – 마당굿 – 부엌굿 – 샘굿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굿에 따라 리듬이 달라져 정취를 더한다.
한편 광양 버꾸놀이는 전장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울 때 북을 울렸던 독전형태를 상당 부분 취하고 있어 북가락이 현란하면서도 웅혼하고 섬세하면 서도 박진감이 넘친다.
광양 버꾸놀이는 전라남도의 전통민속축제인 「남도문화제」에 여러차례 출연하여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 용지 큰줄다리기
○ 우리 고장의 줄다리기 유래
줄다리기는 농악과 함께 농경사회가 정착되면서 주요 민속놀이로 자리잡게 되는데 우리 고장 줄다리기는 이앙법 농사기술이 발전된 시기인 조선시대부터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 광양읍 지역에서는 당시 남쪽에 인덕면과 북쪽에 우장면 사이에 매년 정월 보름날이면 천 여명이 참가하는 큰줄다리기가 밤을 세워가며 벌어졌다. 이 때 지역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나와서 대대적인 응원전을 펼쳤다.
큰줄다리기에 쓰는 줄은 용의 형상을 본 따 만들었는데 규모 또한 거대하여 머리부분의 굵기가 2~3m에 달했으며 길이는 100m를 넘었다. 이처럼 우리고장에선 대규모 큰줄다리기인 인덕면 · 우장면 간에 줄다리기 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마을에서도 크고 작은 줄다리기가 매우 성행하였다.
○ 풍수지리설에 바탕을 둔 용지마을 큰줄다리기
약 300년 전부터 전래되어온 용지마을 큰줄다리기는 풍수지리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용지마을에서도 정월 보름날 밤이면 안마을과 선창마을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안마을에서는 암줄을, 선창마을에서는 숫줄을 만들어 메고 나왔다.
일반적으로 암줄은 황룡을, 숫줄은 청룡을 뜻하는데 마을 앞에 용이 사는 연못이 있다는데서 유래된 “용지”라는 마을이름과 줄다리기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해온다. 또한 마을 지형이 삼베를 감을 때 사용하는 삼각형 나무틀인 “들말” 형국을 하고 있어서 마을이 잘 되려면 들말에 삼베를 걸어두어야 한다고 해서 실을 뜻하는 줄다리기가 유난히 성행했다 한다.
○ 김 풍작을 비는 제례의식과 줄소리 특이
용지 큰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의 규모는 머리 둘레가 1~1.5m이고 길이가 30~40m에 달했으며 참가인원이 많을 때는 수 백명에 달하기도 했다.
줄다리기 순서는 “진잡이 – 고걸이 – 제례 – 줄다리기 – 뒤풀이 마당”으로구성되는데 제례과정에서 용왕신에게 풍어를 빌며 특히 태인도의 주요 소득원인 김 풍작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이 특이하다. 또한 진잡이 과정에서 두 줄이 서로 주고받는 줄소리는 후렴구가 발달하여 웅혼한 기상이 넘쳐나며 고걸이 과정에서는 성행위를 풍자하는 줄소리가 익살스럽다.
한편 용지 큰줄다리기는 1993년 남도문화제에 출연하여 우수작품 발굴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매김소리] 〔후렴구〕
선창몰 사람들아 우이여 – 헤 –
줄 한 번 걸어 도라 우이여 – 헤 –
안 – 몰 사람들아 우이여 – 헤 –
줄 한번 걸어 도라 우이여 – 헤 –
우리 줄은 쇠줄이고 우이여 – 헤 –
느그 줄은 썩은 새끼줄 우이여 – 헤 – (- 줄소리 진잡이 중에서)
어허 숫줄 뭐하는가 우이여 – 헤 –
빨리 와서 걸어주소 우이여 – 헤 –
못가겠네 못가겠네 우이여 – 헤 –
사내체면 꼴이 아닐세 우이여 – 헤 –
암줄이 갈것인가 우이여 – 헤 –
신부주착 못떨겠네 우이여 – 헤 – – 줄소리 고걸이 중에서 –
3. 진월 전어잡이 노래
○ 망덕 앞바다를 비롯, 광양만 일대에서 성행한 전어잡이
섬진강 550리 물길이 광양만으로 합류하는 지점인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앞바다에서는 1983년 이전 까지만 해도 전어잡이가 성행했으며, 광양만 일대에서 전어를 잡아온 전어잡이 배들로 북적대었다.
전어잡이는 배의 길이가 10여미터 되는 배 두척이 짝을 이루어 새벽 썰물때에 바다로 나아간다. 배에는 선장을 비롯하여 각 6명의 어부가 승선하여 그물 줄을 당기고 보조하는일, 고기를 퍼담고 보조하는 일, 식사를 준비하는 일, 전어떼를 그물안으로 몰아 넣는 일등 각기 역할을 맡는다.
바다에 나가서 전어떼를 발견하면 두 배가 각각 따로 가지고 있던 50미터 되는 그물을 결합시키고 폭을 벌려 나아가서 전어떼를 둥그렇게 웨어싼 다음 다시 두배가 만나서 그물을 당겨올린다. 이렇게 해서 그물에 걸린 고기는 둥그런 쪽대(가래)로 배에 퍼 담는다.
전어잡이 노래는 이처럼 어부들이 전어를 잡기위해 바다로 나가고 들어올때 그리고 전어잡이 작업 중에 함꼐 부르는 노래가락이다.
○ 구성지고 흥겨운 노래가락인 전어잡이 노래
진월전어잡이 노래는 “노젓는 소리 – 그물 당기는 소리 – 자진(빠른)가래소리 – 진(느린)가래소리” 등 네 대목으로 엮어져 있는데 그 가락이 매우 구성지고 흥겨웁다. 노래가락은 앞소리꾼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계속하며 받쳐주는 형식을 취한다.
<노젓는 소리> – 아침일찍 전어잡이 나갈때 노를 저으며 부른다.
매기는 소리(앞소리) 받쳐주는 소리 (후렴)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기어차 어야디야
노를 저어라 어야디야
전어 잡으러 어야디야
바다로 가세 어야디야
힘을 내어서 어야디야
잘도 나간다 어야디야
<그물당기는 소리> – 그물로 전어떼를 웨어싼 다음에 그물을 건져 올리면서 부르는 노래
“앞소리” “후렴”
에 용 에 용
에 용 에 용
어기여차 에 용
많이 들었다 에 용
힘을 내어서 에 용
어서 당기세 에 용
얼씨구나 에 용
잘도 한다 에 용
돈도있고 에 용
돈도 있고 에 용
밥도 있다 에 용
<자진가래 소리> – 끌어당긴 그물안에 가득 들어있는 전어를 배에 퍼 올릴 때 빠른 가락으로 흥겹게 부른다.
“앞소리” “후렴”
어 – 낭창 가래야 어-낭차 가래야
어 – 낭차 가래야 어-낭차 가래야
남해바다 용왕님네 어-낭차 가래야
서해바다 용왕님네 어-낭차 가래야
동해바다 용왕님네 어-낭차 가래야
용왕님네 모두다가 어-낭차 가래야
우리선주를 잘도봤네 어-낭차 가래야
어-낭차 가래야 어-낭차 가래야
요만하면 만선일세 어-낭차 가래야
어서어서 퍼담고서 어-낭차 가래야
만선깃발 올려보세 어-낭차 가래야
<진가래소리> – 만선의 기쁨을 안고 포구로 돌아오면서 느리게 부르는 노래
어기야 아 – 하 어기야 아 – 하
어기야 아 – 하 어기야 아 – 하
얼씨구 좋네 절씨구 좋네 어기야 아 – 하
사해 용왕이 도왔는가 어기야 아 – 하
용왕님네 모두다가 어기야 아 – 하
우리 선주를 잘도봤네 어기야 아 – 하
어기야 아 – 하 어기야 아 – 하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어기야 아 – 하
월출동녁에 달떠온다 어기야 아 – 하
부지런히 노를 저어서 어기야 아 – 하
집사람들 기다리는 어기야 아 – 하
선창으로 어서가세 어기야 아 – 하
<자진가래소리>
전어를 가득실은 전어잡이 배가 선창에 들어오면 동네 아줌마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나와 전어를 받아간다. 이때 흥겹고 빠르게 자진가래 가락이 다시 나온다.
전어를 배에서 선창으로 다 퍼 올린후에는 쇠, 북, 장고, 소고 등 풍물을 신명나게 치면서 배와 선창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바탕 어우러져 흥겨운 뒤풀이 한마당을 펼친다.
-. 제26회 남도문화제에서 우수상 수상
진월전어잡이 노래는 지난 97년 9월에 순천에서 개최된 제25회 남도문화제에 진월면 신답마을 박부명외 30명의 주민들이 출연하여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 제26회 남도문화제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