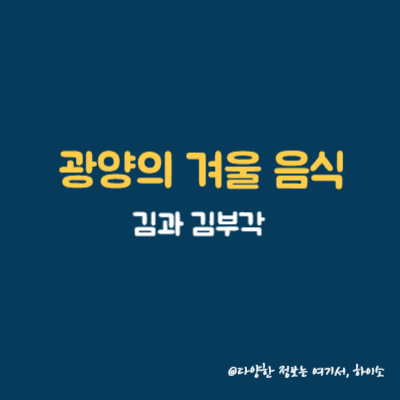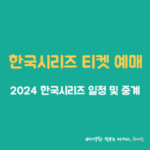광양 김
김부각, 김전, 김국
광양 굴요리
굴무침, 굴떡국
광양 돌배
광양 돌배즙, 돌배 꿀액즙
그 밖의 광양 겨울 음식
파래전, 파래김치, 무왁다지, 닭장, 닭엿
광양의 겨울, 김과 김부각의 맛

우리나라 김 양식의 시식지 광양 태인도
김여익은 영암군 학산면 몽해에서 태어나 1636년 병자호란이 일자 의병을 일으켜 종형 김여준을 따라 청주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자 돌아온 뒤 고향을 떠나 장흥 동백동을 거쳐 1640년 태인도로 들어가 살면서 김을 시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714년(숙종 40) 당시 광양현감이었던 허심이 지었다는 김여익의 묘표에 기록되어 있다. 이 묘표는 남아 있지 않으나 김해 김씨 족보에 남아 있다.
후손들이 해태를 ‘김’이라 하는 것은 김여익이 태인도에서 김의 양식법을 창안하였는데 하동장에서는 태인도의 김가가 기른 것이라 해서 ‘김’이라 했다고 한다. 오늘날 태인도에 남아있는 재래식 양식법은 산죽이나 갈대 따위를 모래펄에 꽂는 한 발 방식이고 완도의 재래식 양식법은 왕대를 가지고 발을 만든 뒤 좀 깊은 갯펄에 꽂은 염홍방식이다.
한말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양식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김 양식이 가장 성행했던 곳은 광양만으로서 연안 도처에 섶이 세워져 있고, 김 양식장이 토지처럼 사유화되어 매매되고 있었다 한다. 일본 강점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였는데 이것은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으로서 반농반어적인 어민에게 적합한 사업이었으며, 일본인들이 특히 김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양식법은 뜬발을 사용하는 법이 개발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김의 해외시장이 상실됨으로써 일대 타격을 받았으나, 얼마 후부터 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해졌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국내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대량생산을 하고 있다. 양식방법도 그물발을 사용하는 망홍식으로 크게 개량되어 생산성이 높아졌다.
김 양식장 사라졌어도 태인도 후손들이 맛 이어가
태인도 주변 바다와 섬진강 하구인 지금의 제철소 일대 바다가 예전에는 드넓은 김 양식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해 양질의 맛좋은 김이 나왔다.
섬진강 물의 수량에 따라 김의 품질이 좌우되었다. 가물어서 강물이 줄면 김이 노랗게 뜨고 품질도 좋지 못했다. 반대로 비가 충분히 내려 섬진강 물이 풍부하게 내려오면 김 색깔이 검고 짙었다.
그러나 태인도는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육지화 되었다. 당연히 김양식장도 사라졌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김 재배지인 광양의 품질 좋은 김 생산 역사는 마감되었다. 하지만 예전 김부각을 만들었던 태인도 주민 후손들 다수가 지금도 태인동에서 어린 시절 만들어 먹었던 김부각을 여전히 만들고 있다. 비록 최고의 김 생산지로서의 명성은 사라졌지만, 최초의 김 시배지라는 자존심과 김을 맛있게 먹을 줄 알았던 광양의 김 문화는 아직도 이처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주민들은 김 양식장을 논밭처럼 사고팔았다. 음력으로 8월 추석 무렵 바다에 말뚝을 박아놓는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김 포자가 붙어 증식한다. 김이 차츰 자라면 음력으로 10월 그믐께부터 김을 따기 시작해 이듬해 음력 3월쯤까지 거둬들인다.
배를 타고 나가서 김 따는 작업을 모두 마쳐도 바로 돌아올 수 없었다. 물이 들어와야 물골을 따라 배를 타고 되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을 딸 때는 힘든 노동을 견뎌야 했고, 김 실은 배에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는 추위를 견뎌야 했다. 김 한 장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생한 이들의 수고가 오롯이 들어있다. 불에 구워야 김이 고소한 맛을 내는 것은 어쩌면 추웠던 바다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대개 김은 가족단위의 노동으로 만들었다. 집으로 가져온 김은 발을 놓고 틀에 부어 ‘가그대’로 불리는 건조대에 걸어 말렸다. 이 과정에서 건조대에 김을 가져다가 거는 단순한 작업 등은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했다. 김 생산은 당시 태인도와 진월면 주민들의 큰 소득원이었다.
태인도에서 나고 자란 진형엽 씨와 김부각

진월면 선소리 진형엽(여, 71)씨는 태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당시 태인도는 앞 바다에 김 양식장이 넓었다. 여기서 나온 김으로 마을 주민들이 명절 때면 집집마다 김부각을 만들어 먹었다. 진씨도 어려서부터 모친이 만드는 김부각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다.
예전에는 4인 1조 분업으로 김부각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을 작업자 앞에 가져다 놓는 사람, 풀을 떠서 김에 바르는 사람, 참깨를 뿌리는 사람, 완성된 김을 건조대에 너는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사람이 꼭 네 명이 안 되더라도 두 세 사람이 적당히 작업을 분배해 능률을 높였다.
이 가운데 완성된 김을 너는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해야 했기때문에 겨울에는 손이 시려 가장 고생을 했다고 한다. 또한 실내라고 해도 너무 더운 곳에서는 김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그다지 덥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했다. 이래저래 겨울철 김부각 만드는 작업은 추위와 친해져야만 했다.
진씨는 지금도 날이 좋으면 김부각을 만들어 말린다. 노년에 접어들어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김에 찹쌀 풀을 바르는 그녀의 손놀림은 건반 위에서 춤추는 피아니스트의 손 같았다. 무정한 세월도 여러 해 쌓인 녹록치 않은 진씨의 내공을 어쩌지는 못했다.
틈틈이 만든 진씨의 김부각은 인근의 대형 고급 식당이나 단골 고객들의 주문을 대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100장 한 박스에 몇 만원을 받고 있어, 들인 공이나 재료비에 비하면 가격이 너무 헐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